386들이 독점한 문화 세상에 첫발 내미는 조카들의 '추억 놀이'
[초이스경제 장경순의 만필세상] 종이접기 김영만이 누군지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다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 오래 나왔던 사람이라고 해서야 우리 조카들 한참 어릴 때 프로에 나온 사람인 걸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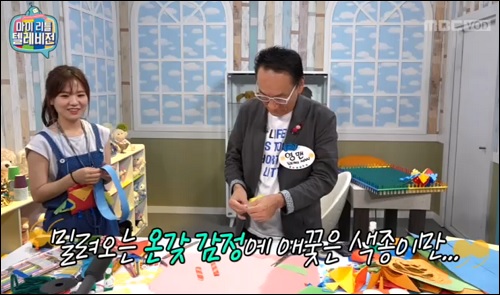
지금부터 20여 년 전, 이 삼촌 꽤 젊었을 때다.
휴일 날, 늦잠을 자는데 엄마 아버지 계시는 방의 TV에서 안 나오던 풍짝풍짝 소리가 난다. 잠이 깨서 생각해 보니 어제부터 조카들이 몰려와 있었다.
저 프로 끝나면 저것들이 이제 내 방으로 쳐들어 올 텐데, 어떻게 잠을 자나... “냉장고에 메로나 있어”라고 하면 부엌으로 몰려가곤 하는데 과연 오늘 재고가 있을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는데 갑자기 맑고 명랑하기 그지없는 노래가 들려온다.
“풍선타고 동동동, 꿈을 타고 동동동~~ 우리는 좋아요 하나둘셋 정말정말 좋아요 하나둘셋”
순간 밀려오는 깨달음이란, 그동안 저 녀석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을 했던가다. 지난번 왔다가 빠뜨리고 간 꼬마 신발이 현관 선반 위에 놓인 것을 보면서 이번에 오면 정말 열심히 데리고 놀아야지 다짐했지 않는가.
부스스 일어나 안방으로 기어갔다. 내가 안방에 합류하는 순간부터 집안은 난리법석이다. 엄마는 나한테 “밥 먹어라”고 성화, 애들은 “삼촌이 자꾸 깨물어” “삼촌이 발로 꼬집어” 고자질, 형과 누나는 애들 괴롭힌다고 나를 구박, 형수와 매형만 아무 말이 없다.
아버지는 건너편 방에서 식구들 모인 것만 흐뭇하신 듯 전화기로 가족들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서둘러 기원약속을 잡으시는 통화였다. 난리통에서 탈출하시는 면도 있지만 일단 출타를 하셔야 애들 먹을 거나 가지고 놀 장난감을 구해 오실 것 아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마리텔 김영만’에서 어린 시절 추억이 쏟아지지만, 나는 ‘풍선타고 동동동’에서 젊은 삼촌 시절이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본지에서 마리텔 김영만 기사를 쓴 기자도 우리 조카들 또래다.

인기 뉴스에 등장하는 주제 치고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종이접기 김영만 만큼은 전혀 생소한 얘기였다. 조카들이 TV유치원 보는 줄만 알았지 거기 누가 나오는지는 전혀 몰랐다.
돌이켜보니,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담론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 또래가 붙잡고 있었다. ‘386’으로 잘 알려져서 이제 586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스무 살 대학생활을 막 시작하던 때부터, 심지어 폭압통치를 일삼던 군사 독재자마저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학원자유화’라고 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교문을 틀어막지만, 교문 안에는 단 한발자국도 들이지 않는 이색적인 모습이 우리 입학과 함께 시작됐다.
이런 환경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여한 없이 다 하도록 자란 사람들이 ‘386’이다.
정치뿐만 아니다. 문화도 거침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세대여서 우리가 보고 즐긴 것은 오늘날 모두 해당 분야의 ‘클래식’ 반열에 올랐다. 매출액만 따지면 10대들이 좋아하는 문화코드들이 석권하고 있지만, ‘거장’ ‘클래식’ ‘레전드’ 이런 칭호들이 중시되는 세상은 지금도 우리 수중에 있다.
아직은 뭐든지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은 ‘클래식’이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중학생 때는 가요보다 팝송을 들었는데, 당시의 팝송 가수들이 지금 국내 뉴스에 등장할 때는 모두 ‘팝의 거장’이다. 핑크 플로이드나 딥 퍼플 같은 난해한 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는 국내 인기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매니아들 사이에서 폄하되던 ABBA 스모키 등 ‘한국형 팝’도 현재 ‘팝의 클래식’ 말석을 차지하고 있다. ‘Just when I needed you most’라는 유명한 노래가 카페에서 나올 때 랜디 밴 워머라고 가수까지 아는 척 하면 아직은 손해보다 득이 더 많다.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퀸은 1970년대 후반 전성기를 맞았지만 ‘불세출의 록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건 당시 대학생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 세대는 팝송 듣는 게 극히 일부 매니아들만의 일이었다. 반면 이 때 중학생들은 팝을 안 들으면 친구 대화에 끼지 못 할 정도였다. 우리 386들이다.
야구도 조계현 정도는 논할 수 있어야 야구 좀 본 사람 취급 받는다. 해태 조계현보다 군산상고 조계현으로서다. 그래서 조계현의 단짝포수라고 하면 장채근(해태타이거즈)이 아니라 장호익(군산상고)이라고 해야 정답이 된다. 조계현은 1964년생이다.
‘모래시계’ 세대가 한국의 시대문화를 지배한 건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말없이 앞선 시대를 보냈던 선배님들에게는 송구한 마음도 다소 들지만, 이 형님들은 이제 나오지도 않는 25도짜리 두꺼비 소주 한 잔으로 말씀하실 뿐이니 어쩌겠는가.

그러나 흐르는 물에는 멈춤이 있을 수 없다. 칠순 팔순 되도록 이런 담론의 독재를 즐기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때 즐겨듣거나 놀던 것을 찾으면 그 때 사람들은 “뭘 그런 걸 여태 찾느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옛날 짬뽕’이라고 하는 메뉴는 치즈를 한 조각 녹인 것일지도 모른다.
‘마리텔’ 김영만은 우리들의 독재를 몰아내는 첫번째 신호다. 그 시절 꼬마들은 이제 ‘코딱지’라는 단어를 통한 결집까지 과시하고 있다.
늦잠 자는 삼촌을 뒤흔들어 깨우던 애들도 벌써 이렇게 자기들 어릴 적 일들을 그리워하는 시절이 됐다. ‘종이접기’ 아저씨의 선풍적 인기는 이제 ‘담론의 주도권’ 세대가 바뀌는 첫 번째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턱없는 거짓말은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같다. 그것은 우리보다 더 어른들의 얘기다.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될까. 이것도 예전 선배님들의 표현방식 같다. 그리고 ‘정의 사회’라는 표현이 제5공화국 민주정의당을 연상시켜서 우리와는 상극 같다.
그냥 “못 참을 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외쳐댔다”고 하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좀 그렇다. 폼 나게 규정을 내려 주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일이 아닌 모양이다. 어쩌면 이것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늦잠 자던 삼촌을 깨우던 조카들이 할 일일지도 모른다. 늦게까지 결혼 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얹혀 살던 우리 삼촌과 이모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한 줄 요약 말이다.

